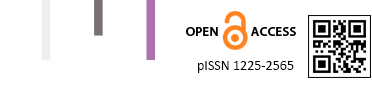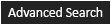|
 |
- Search
| Korean J Art Hist > Volume 315; 2022 > Article |
|
Abstract
Abstract
Notes
2) 20ņäĖĻĖ░ ņ┤ł ņ░ĮļŹĢĻČüņØś ļ│ĆĒÖöļź╝ ļŗżļŻ¼ ņŚ░ĻĄ¼ļĪ£ļŖö Ļ╣ĆņĀĢļÅÖ, ŃĆīĻ░£ĒÖöĻĖ░ ņÜ░ļ”¼ ĻČüĻČÉņŚÉ ņØ┤ņ×ģļÉ£ ņä£ņ¢æņÜöņåīļōż-ņ░ĮļŹĢĻČü ĒؼņĀĢļŗ╣ņØä ņżæņŗ¼ņ£╝ļĪ£ŃĆŹ, ŃĆÄĒĢ£ĻĄŁĻ▒┤ņČĢņŚŁņé¼ĒĢÖĒÜī 2006ļģäļÅä ņČśĻ│äĒĢÖņłĀļ░£Ēæ£ļīĆĒÜī ļģ╝ļ¼Ėņ¦æŃĆÅ (ĒĢ£ĻĄŁĻ▒┤ņČĢņŚŁņé¼ĒĢÖĒÜī, 2006.5), pp. 202-224; ĒĢ£ļ│æņłś┬Ęļ░Ģņ¦äĒÖŹ┬ĘĒĢ£ļÅÖņłś, ŃĆī20ņäĖĻĖ░ ņ┤ł ņä£ņ¢æļ¼Ėļ¼╝ņØś ļÅäņ×ģĻ│╝ ĻČüĻČÉ ņĀĢņ╣©ņØś Ļ│ĄĻ░ä ļ│ĆĒÖö-ņ░ĮļŹĢĻČü ĒؼņĀĢļŗ╣ņØä ņżæņŗ¼ņ£╝ļĪ£ŃĆŹ, ŃĆÄļīĆĒĢ£Ļ▒┤ņČĢĒĢÖĒÜī ņČśĻ│äĒĢÖņłĀļ░£Ēæ£ļīĆĒÜīļģ╝ļ¼Ėņ¦æŃĆÅ 31ĻČī 1ĒśĖ(ļīĆĒĢ£Ļ▒┤ņČĢĒĢÖĒÜī, 2011.4), pp. 153-154; ņÜ░ļÅÖņäĀ┬ĘĻĖ░ņäĖĒÖ®, ŃĆī1908ļģä ņ░ĮļŹĢĻČü ņØĖņĀĢņĀä ņØ╝Ļ│ĮņØś Ļ░£ņĪ░ņŚÉ Ļ┤ĆĒĢ£ ņŚ░ĻĄ¼ŃĆŹ, ŃĆÄĻ▒┤ņČĢņŚŁņé¼ņŚ░ĻĄ¼ŃĆÅ 23 2ĒśĖ(2014.4), pp. 53-64;, ŃĆī1920ļģä ņ░ĮļŹĢĻČü ļé┤ņĀä ņØ╝Ļ│ĮņØś ņ×¼Ļ▒┤ņŚÉ Ļ┤ĆĒĢ£ ņŚ░ĻĄ¼ŃĆŹ, ŃĆÄĻ▒┤ņČĢņŚŁņé¼ņŚ░ĻĄ¼ŃĆÅ 23 3ĒśĖ(2014.6), pp. 43-54; ņØ┤Ļ░ĢĻĘ╝, ŃĆīĶ┐æõ╗Żµ£¤ µśīÕŠĘÕ«« Ļ▒┤ņČĢņØś ļ│Ćņ▓£ņŚÉ ļīĆĒĢ£ ņŚ░ĻĄ¼ŃĆŹ, ŃĆÄĻ░Ģņóīļ»ĖņłĀņé¼ŃĆÅ 42(2014), pp. 11-31; ņןĒĢäĻĄ¼, ŃĆī20ņäĖĻĖ░ ņĀäļ░śĻĖ░ ņĪ░ņäĀņÖĢņŗżņØś ļ│ĆĒÖöņÖĆ ņ░ĮļŹĢĻČü Ļ▒┤ņČĢ ĒÖ£ļÅÖņØś ņä▒Ļ▓®ŃĆŹ (ņä£ņÜĖļīĆĒĢÖĻĄÉ Ļ▒┤ņČĢĻ│ĄĒĢÖĻ│╝ ļ░Ģņé¼ĒĢÖņ£äļģ╝ļ¼Ė, 2014); ņØ┤ĻĘ£ņ▓Ā, ŃĆī1907~1910ļģä ņ░ĮļŹĢĻČü ņżæņŗ¼ Ļ│ĄĻ░äņØś ņ×¼ĒÄĖŃĆŹ, ŃĆÄļīĆĒĢ£Ļ▒┤ņČĢĒĢÖĒÜī ļģ╝ļ¼Ėņ¦æ-Ļ│äĒÜŹĻ│äŃĆÅ 31 6ĒśĖ(ļīĆĒĢ£Ļ▒┤ņČĢĒĢÖĒÜī, 2016.06), pp. 151-162; Ļ╣Ćņ¦ĆĒśä, ŃĆīņ░ĮļŹĢĻČü ļé┤ņĀä ņØ╝Ļ│Į Ļ│Ąņé¼ļĪ£ ļ│┤ļŖö ņØ╝ņĀ£Ļ░ĢņĀÉĻĖ░ ĻČüņĀä ļ│äņĀäŃĆŹ, ŃĆÄĻ▒┤ņČĢņŚŁņé¼ņŚ░ĻĄ¼ŃĆÅ 29 2ĒśĖ(2020), pp. 63-74. ļō▒ņØ┤ ņ׳ļŗż.
3) µśīÕŠĘÕ««ņØä õ┐« ńÉåĒä░ņØĖ Õż¦ ńÜć ÕĖØ ķÖøõĖŗ Ķć© ÕŠĪ ņŗż µ«┐ķ¢Żļ¦ī µ¢»ķƤõ┐« ńÉåļŗżļŹöļØ╝. ŃĆÄÕż¦ ķ¤ōµ»ÅµŚźńö│ÕĀ▒ ŃĆÅ, 1907ļģä 10ņøö 10ņØ╝.
4) ņØĖņĀĢņĀäņØĆ ņØ╝ļ│Ė ļ®öņØ┤ņ¦ĆĻČüņŚÉņä£ Ļ│ĄņŗØ Ē¢ēņé¼ņÖĆ ņ▓£ĒÖ®ņØä ņĢīĒśäĒĢśļŖö Ļ│ĄĻ░äņØ┤ņŚłļŹś Ēæ£ĻČüņĀä(ĶĪ©Õ««µ«┐)ņØś ĻĄ¼ņĪ░ņÖĆ ĻĖ░ļŖźņØ┤ ņ£Āņé¼ĒĢśņśĆļŗż. ņØ╝ļ│Ė ļ®öņØ┤ņ¦ĆĻČüņØś Ēæ£ĻČüņĀäĻ│╝ Ļ┤ĆļĀ©ĒĢśņŚ¼ Õ▒▒Õ┤Äķ»øõ╗ŗ, ŃĆīµśÄµ▓╗Õ««µ«┐Ńü«Ķ©ŁĶ©łÕåģÕ«╣Ńü½Ķ”ŗŃéŗÕäĆńż╝ń®║ķ¢ōŃü«µäÅÕīĀńÜäńē╣ÕŠ┤ŃĆŹ, ŃĆĵŚźµ£¼Õ╗║ń»ēÕŁ”õ╝ÜĶ©łńö╗ń│╗Ķ½¢µ¢ćķøåŃĆÅ 69(2004. 04), pp. 169-176. ņ░ĖņĪ░; ņÜ░ļÅÖņäĀ┬ĘĻĖ░ņäĖĒÖ®, ņĢ×ņØś ļģ╝ļ¼Ė(2014. 4)ņŚÉņä£ļŖö <µśÄµ▓╗Õ««µ«┐ń½ŻÕĘźÕ╣│ķØóÕ£¢>ņŚÉ ļéśĒāĆļé£ ļ®öņØ┤ņ¦ĆĻČüņØś ĻĄ¼ņĪ░, ļ®öņØ┤ņ¦ĆĻČüņØś ņĪ░ņśüņØä ņŻ╝ļÅäĒĢ£ ņØĖļ¼╝ ļō▒ņŚÉ ļīĆĒĢ£ ļ╣äĻĄÉ┬ĘļČäņäØņØä ĒåĄĒĢ┤ ņØĖņĀĢņĀäņØ┤ ļ®öņØ┤ņ¦ĆĻČüņØä ļ¬©ļ░®ĒĢśņŚ¼ Ļ░£ņĪ░ļÉśņŚłņØīņØä ļ░ØĒśöļŗż. ņØ┤ņÖĖņŚÉļÅä Ļ░üņŻ╝ 2ņŚÉ ņ¢ĖĻĖēļÉ£ ņŚ░ĻĄ¼ļōżņØä ĒåĄĒĢ┤ ņØ╝ļ│ĖņØś ļ®öņØ┤ņ¦ĆĻČüĻ│╝ ĻĘ╝ļīĆ ņ░ĮļŹĢĻČüņØś Ļ▒┤ņČĢ Ļ│ĄĻ░äĻ│╝ņØś ņŚ░Ļ┤Ćņä▒ņØ┤ ĒÖĢņØĖļÉśņŚłļŗż.
5) ņ░ĮļŹĢĻČü ņØĖņĀĢņĀäĻ│╝ Ļ┤ĆļĀ©ĒĢśņŚ¼ ĻĘ╝ļīĆĻĖ░ņŚÉ ņ×æņä▒ļÉ£ Ļ▒┤ņČĢļÅäļ®┤ņØ┤ ņĢĮ 13ņóģ ņĀäĒĢ£ļŗż. ĻĘ╝ļīĆ Ļ▒┤ņČĢļÅäļ®┤ņØĆ ĒĢ£ĻĄŁĒĢÖņżæņĢÖņŚ░ĻĄ¼ņøÉ ņןņä£Ļ░ü, ĻĄŁļ”Įļ¼ĖĒÖöņ×¼ņŚ░ĻĄ¼ņåī, ĻĄŁĻ░ĆĻĖ░ļĪØņøÉ, ņä£ņÜĖļīĆĒĢÖĻĄÉ ĻĘ£ņןĻ░üĒĢ£ĻĄŁĒĢÖņŚ░ĻĄ¼ņøÉ ļō▒ņŚÉ ņåīņןļÉśņ¢┤ ņ׳ļŗż.
6) Ļ░£ņĪ░ļÉ£ ņØĖņĀĢņĀäņØś Ļ│ĄĻ░äņŚÉ Ļ┤ĆļĀ©ĒĢ£ ņé¼ņ¦ä ņ×ÉļŻīļŖö ļ¼ĖĒÖöņ×¼ņ▓Ł ņ░ĮļŹĢĻČüĻ┤Ćļ”¼ņåī, ŃĆÄņØ╝ļ│Ė ĻČüļé┤ņ▓Ł ņåīņן ņ░ĮļŹĢĻČüņé¼ņ¦äņ▓®ŃĆÅ (ļ¼ĖĒÖöņ×¼ņ▓Ł ņ░ĮļŹĢĻČüĻ┤Ćļ”¼ņåī, 2006) ņ░ĖĻ│Ā.
7) Ēśäņ×¼ņØś ņØĖņĀĢņĀäņØĆ 1995ļģä ļ│ĄņøÉĻ│Ąņé¼ļź╝ ĒåĄĒĢśņŚ¼ ņĪ░ņäĀĒøäĻĖ░ņØś ņØĖņĀĢņĀäņ£╝ļĪ£ ļ│ĄņøÉĒĢ£ Ļ▓āņØ┤ļŗż.
8) ņĪ░ņäĀņŗ£ļīĆ ņÖĖĻĄÉņØśļĪĆņØś Ļ│ĄĻ░äņØĆ ņĀĢņĀäņØś ļé┤ļČĆĻ░Ć ņĢäļŗī ņÖĖļČĆņśĆļŗż. ņĪ░ņŗ£ļé┤, ŃĆīĒĢ£ĻĄŁ ĻĘ╝ļīĆ ĻČüĻČÉĻ▒┤ņČĢņØś Ļ│ĄĻ░äĻ│╝ ņןņŗØ ĒŖ╣ņä▒ ņŚ░ĻĄ¼ŃĆŹ (ĒÖŹņØĄļīĆĒĢÖĻĄÉ ļ»ĖņłĀņé¼ĒĢÖĻ│╝ ļ░Ģņé¼ĒĢÖņ£äļģ╝ļ¼Ė, 2022), pp. 8-13.
9) Ēśäņ×¼ ņäĀņĀĢņĀä ļé┤ļČĆņŚÉ ļ░░ņ╣śļÉ£ ņ¢┤ņóīļŖö ĒÅēņāüņØś ĒśĢĒā£ļĪ£ 19ņäĖĻĖ░ Ēøäļ░śņŚÉņä£ 20ņäĖĻĖ░ ņ┤łņŚÉ ņĀ£ņ×æļÉ£ ņ¦äņŚ░(ķĆ▓Õ«┤)┬Ęņ¦äņ░¼(ķĆ▓ķźī) ņØśĻČżņØś ļÅäņäż(Õ£¢Ķ¬¬)ņŚÉ ĻĘĖļĀżņ¦ä ņÜ®ĒÅēņāü(’¦äÕ╣│Õ║Ŗ)Ļ│╝ ĒśĢĒā£ ļ░Å ĻĘ£Ļ▓®ņØ┤ ļ¦żņÜ░ ņ£Āņé¼ĒĢśļŗż. ņĪ░ņŗ£ļé┤, ŃĆīļīĆĒĢ£ņĀ£ĻĄŁĻĖ░ Õ««õĖŁ Õ«┤õ║½ńö© Õ«ČÕģĘ ņŚ░ĻĄ¼ŃĆŹ, ŃĆÄńŠÄĶĪōÕÅ▓ÕŁĖńĪÅń®ČŃĆÅ 264(2009), pp. 145-146; ņ¢┤ņóīļĪ£ ņé¼ņÜ®ļÉ£ ņóīĻĄ¼ņÖĆ ņ¢┤ņóī Ļ│ĄĻ░äņŚÉ ļīĆĒĢ£ ņŚ░ĻĄ¼ļĪ£ ņĀ£ņåĪĒؼ, ŃĆīņĪ░ņäĀ ĒøäĻĖ░ ĻĄŁņÖĢņØś ÕŠĪÕ║¦ ņŚ░ĻĄ¼ŃĆŹ, ŃĆÄļ»ĖņłĀņé¼ņŚ░ĻĄ¼ŃĆÅ 42(2022), pp. 7-40ņ░ĖĻ│Ā.
10) 1917ļģä 11ņøö 10ņØ╝ ņ░ĮļŹĢĻČü ļīĆņĪ░ņĀäņØś ņä£ņś©ļÅīņŚÉ ĒÖöņ×¼Ļ░Ć ļ░£ņāØĒĢśņśĆļŗż. ŌĆ” ņØĖņĀĢņĀäĻ│╝ ņäĀņĀĢņĀäņØĆ ļ¼┤ņé¼ĒĢśņśĆņ¦Ćļ¦ī ĒؼņĀĢļŗ╣, ļīĆņĪ░ņĀä, Ļ▓ĮĒøłĻ░ü, ŌĆ” ļō▒ ļ¼┤ļĀż 800 ņŚ¼ĒÅēņŚÉ ļŗ¼ĒĢśļŖö Ļ▒┤ļ¼╝ļōżņØ┤ ļ¬©ļæÉ ļČłĒāĆļ▓äļĀĖļŗż. ŃĆÄņł£ņóģņŗżļĪØļČĆļĪØŃĆÅ, 1917ļģä 11ņøö 10ņØ╝.
11) µØÄńÄŗĶüĘķĢĘÕ«ś ÕŁÉńłĄ ķ¢öõĖÖÕźŁ ņØ┤ĒĢś ķ½śńŁēÕ«śņØ┤ ĒÖöņ×¼ ņØ┤ĒøäņØś ņ▓śļ”¼ ļ░®ļ▓ĢņŚÉ ļīĆĒĢśņŚ¼ ĒÜīņØśļź╝ ĒĢśĻ│Ā, ŌĆ” µ¢░µ«┐ņØĆ ņĪ░ņäĀņŗØņ£╝ļĪ£ Ļ▒┤ņČĢĒĢśĻĖ░ļĪ£ ĒĢśĻ│Ā, ĻĘĖ ņÖĖņŚÉļŖö ņä£ņ¢æņŗØņØä ņ░ĖņĪ░ĒĢśĻĖ░ļĪ£ ĒĢśņśĆļŗż. ŌĆ” ŃĆÄņł£ņóģņŗżļĪØļČĆļĪØŃĆÅ, 1917ļģä 11ņøö 14ņØ╝.
12) <Õż¦ķĆĀµ«┐Õ╣│ķØóÕ£¢>ņŚÉļŖö 1912ļģä ļīĆņĪ░ņĀä ņłśļ”¼ņŗ£ ņ¢æņŗ¼ĒĢ®Ļ│╝ ĒؼņĀĢļŗ╣ņØä ņŚ░Ļ▓░ĒĢśļŖö ļ│ĄļÅäĻ░Ć ĻĘĖļĀżņĀĖ ņ׳ĻĖ░ ļĢīļ¼ĖņŚÉ 1912~17ļģä ņé¼ņØ┤ņŚÉ ņĀ£ņ×æļÉ£ Ļ▓āņ£╝ļĪ£ ņČöņĀĢļÉ£ļŗż. ĒĢ£ĻĄŁĒĢÖņżæņĢÖņŚ░ĻĄ¼ņøÉ ņןņä£Ļ░ü, ŃĆÄĶ┐æõ╗ŻÕ╗║ń»ēÕ£¢ķØóķøå-ĒĢ┤ņäżĒÄĖŃĆÅ (ĒĢ£ĻĄŁĒĢÖņżæņĢÖņŚ░ĻĄ¼ņøÉ ņןņä£Ļ░ü, 2009), p. 52.
13) ņÜ░ļÅÖņäĀ┬ĘĻĖ░ņäĖĒÖ®, ņĢ×ņØś ļģ╝ļ¼Ė(2014. 6), pp. 43-54ņŚÉņä£ļŖö Ļ┤ĆļĀ© ņŗĀļ¼ĖĻĖ░ņé¼ņØś Ļ▓ĆĒåĀņÖĆ Ēśäņן ņĪ░ņé¼ļź╝ ĒåĄĒĢ┤ 1920ļģä ņ×¼Ļ▒┤ļÉ£ ļīĆņĪ░ņĀäĻ│╝ ĒؼņĀĢļŗ╣ņØ┤ ĒĢ£(ķ¤ō)┬ĘņØ╝(µŚź)┬Ęņ¢æ(µ┤ŗ)ņØś ņĀłņČ®ļÉ£ ņ¢æņŗØņØä Ļ░Ćņ¦ĆĻ│Ā ņ׳ņŚłņØīņØä ļ░ØĒśöļŗż. ļ│Ė ļģ╝ļ¼ĖņŚÉņä£ļŖö ņØ┤ļ¤¼ĒĢ£ ĒĢ┤ņäØņØä ņ░ĖĻ│ĀĒĢśņŚ¼ ņ×¼Ļ▒┤ļÉ£ ļīĆņĪ░ņĀäņØ┤ ņĀäĒåĄņĀü ņ╣©ņĀäĻ│╝ļŖö ļŗżļźĖ ņ¢æņāüņØś Ļ│ĄĻ░ä ĒŖ╣ņä▒ņØä Ļ░¢ņČöĻ│Ā ņ׳ņŚłņØīņØä Ļ░ĢņĪ░ĒĢśņśĆļŗż.
14) ĒÅēņāüņŗ£ ĻĖ░Ļ▒░ĒĢśļŖö ļ░®ņØĆ ņśżļźĖĒÄĖņ£╝ļĪ£ 20ņŚ¼ĒÅēņØś ņś©ļÅīņŗżņØ┤ļ®░, ĻĘĖ ļ░®ņŚÉ ņŚ░Ļ▓░ĒĢśņŚ¼ ņØ┤ļ░£ņŗż, Ļ░ĢņŖĄņŗż ļō▒ņØ┤ ņŚ░Ļ▓░ļÉ£ļŗż. ŃĆĵ»ÅµŚźńö│ÕĀ▒ŃĆÅ, 1920ļģä 1ņøö 17ņØ╝.
15) ļīĆņĪ░ņĀäņØĆ µØÄńÄŗÕÉīÕ”āÕģ®µ«┐õĖŗņØś ÕŠĪĶĄĘÕ▒ģĒĢśļŖö Õ««Õ«żņØ┤ļŗż. ŌĆ”ņśżļźĖĒÄĖņØĖ Ķłłń”ÅĶ╗ÆņØ┤ļØ╝ĒĢśļŖö ńÄŗµ«┐õĖŗņØś ÕŠĪÕ▒ģÕ«żņØ┤ļ®░ ņóīņĖĪņ£╝ļĪ£ Ķ¦ĆńÉåķ¢ŻņØ┤ļØ╝ ĒĢśļŖö Õ”āµ«┐õĖŗņØś ÕŠĪÕ▒ģÕ«żņØ┤ µŗ£ĶüĮļÉ£ļŗż, ŃĆīĶ”▓’©ŖÕäĆļź╝ ĶĪīĒĢśņŗż Õż¦ķĆĀµ«┐ µŗ£Ķ¦ĆĶ©śŃĆŹ, ŃĆĵ»ÅµŚźńö│ÕĀ▒ŃĆÅ, 1922ļģä 4ņøö 26ņØ╝.
16) ņ¢æņĀ£ļĪ£ Ļ▒┤ņČĢļÉśļ”¼ļØ╝ļŖö ļ¦ÉņØ┤ ņ׳ņ£╝ļéś ņ¢æņĀ£ļĪ£ Ļ▒┤ņČĢĒĢ©ņØĆ ņ░ĮļŹĢĻČü ņĢłņØś ļŗżļźĖ Ļ▒┤ņČĢļ¼╝Ļ│╝ ņä£ļĪ£ ļīĆĒĢśņŚ¼ ņĪ░ĒÖöĻ░Ć Ļ│Āļź┤ņ¦Ć ļ¬╗ĒĢ£ Ļ│ĀļĪ£ ņ×ÉņŚ░Ē׳ ņØ┤ņĀäļīĆļĪ£ ņĪ░ņäĀņŗØņØś ĻČüņĀĢņØä Ļ▒┤ņČĢĒĢśĻĖ░ļĪ£ Ļ▓░ņĀĢĒĢśņśĆļŗż. ŃĆĵ»ÅµŚźńö│ÕĀ▒ŃĆÅ, 1917ļģä 12ņøö 20ņØ╝.
17) ĒؼņĀĢļŗ╣ņØś Ļ│ĀņĀĢņŗØ Ļ░ĆĻĄ¼ ļ░░ņ╣śņÖĆ Ļ┤ĆļĀ©ĒĢśņŚ¼ 1920ļģäļīĆ ĻĘĖļĀżņ¦ä <ńåÖµö┐ÕĀéÕŠĪÕ▒ģķ¢ōÕ«ČÕģĘķģŹńĮ«>ļź╝ ņ░ĖĻ│ĀĒĢĀ ņłś ņ׳ļŗż. <ńåÖµö┐ÕĀéÕŠĪÕ▒ģķ¢ōÕ«ČÕģĘķģŹńĮ«>ļŖö ĒĢ£ĻĄŁĒĢÖņżæņĢÖņŚ░ĻĄ¼ņøÉ ņןņä£Ļ░ü, ņĢ×ņØś ņ▒ģ, p. 56. ņØś ļÅäĒīÉ 059 ņ░ĖĻ│Ā.
18) ņĀäĻ░üĻ│╝ ņĀäĻ░ü ņé¼ņØ┤ļź╝ ļ│ĄļÅäļĪ£ ņŚ░Ļ▓░ĒĢśņŚ¼ ĒåĄĒĢ®ļÉ£ ĻĄ¼ņĪ░ļź╝ ĒśĢņä▒ĒĢśļŖö Ļ│ĄĻ░ä ĒŖ╣ņä▒ņØĆ ņØ╝ļ│ĖņØś ļ®öņØ┤ņ¦ĆĻČüĻ│╝ ņ£Āņé¼ĒĢśļ®░, 1908ļģä Ļ░£ņĪ░ļÉ£ ņØĖņĀĢņĀäĻ│╝ 1920ļģä ņ×¼Ļ▒┤ļÉ£ ļīĆņĪ░ņĀä ņśüņŚŁņŚÉ ņśüĒ¢źņØä ļ»Ėņ│żļŗż. ņÜ░ļÅÖņäĀ┬ĘĻĖ░ņäĖĒÖ®, ņĢ×ņØś ļģ╝ļ¼Ė(2014. 6), p. 46.
19) Ļ▓Įļ│ĄĻČü ņ¦æņśźņ×¼ņØś Ļ▒┤ļ”Į ļ░░Ļ▓ĮĻ│╝ Ļ│ĄĻ░ä ĒŖ╣ņ¦ĢņØĆ ņĪ░ņŗ£ļé┤, ņĢ×ņØś ļģ╝ļ¼Ė(2022), pp. 30-34.
21) 20ņäĖĻĖ░ ņ┤ł ņ░ĮļŹĢĻČü ņØĖņĀĢņĀäņØ┤ Ļ░£ņĪ░ļÉśļ®┤ņä£ ļŗ╣Ļ░ĆĻ░Ć ĒĢ┤ņ▓┤ļÉśĻ│Ā, ņØ╝ņøöņśżļ┤ēļ│æ ļīĆņŗĀ ļ┤ēĒÖ®ļÅäĻ░Ć ļČĆņ░®ļÉśņŚłļŗż. ļ┤ēĒÖ®ļÅä ņĢäļלņŚÉļŖö Ļ░£ņĪ░ ņØ┤ņĀäņØś ņØĖņĀĢņĀä ļŗ╣Ļ░Ć ĒĢśļŗ© ļČĆļČäņØä ņØ╝ļ│ĖņŗØ ļ»Ėļŗ½ņØ┤ļ¼Ėņ£╝ļĪ£ Ļ░£ņĪ░ĒĢśņŚ¼ ĻĘĖ ņ£äņŚÉ <ņé¼ļĀ╣ļÅä>Ļ░Ć ĻĘĖļĀżņĪīļŗż. <ņé¼ļĀ╣ļÅä>ļŖö ņÜ®, Ļ▒░ļČü, ļ┤ēĒÖ®, ĻĖ░ļ”░ņØä ņåīņ×¼ļĪ£ ĒĢ£ ĻĘĖļ”╝ņ£╝ļĪ£ ĻĘ╝ļīĆ ņØ╝ļ│ĖĒÖöĒÆŹņŚÉ ņśüĒ¢źņØä ļ░øņĢä ņĀ£ņ×æļÉśņŚłļŗż. ļ░Ģņ£żĒؼ, ŃĆī20ņäĖĻĖ░ ņ░ĮļŹĢĻČü ņØĖņĀĢņĀä ļŗ╣Ļ░Ć(ÕöÉÕ«Č)ņØś ļ│ĆĒśĢ Ļ│╝ņĀĢ Ļ│Āņ░░-ņØ╝ņøöņśżļ┤ēļ│æ, ļ┤ēĒÖ®ļÅä, ņé¼ļĀ╣ļÅäļź╝ ņżæņŗ¼ņ£╝ļĪ£-ŃĆŹ, ŃĆÄĻ│ĀĻČüļ¼ĖĒÖöŃĆÅ 14(2021), pp. 122-127.
22) ņ░ĮļŹĢĻČü ņØĖņĀĢņĀä <ļ┤ēĒÖ®ļÅä>ņÖĆ Ļ┤ĆļĀ©ļÉ£ ņŚ░ĻĄ¼ļĪ£ Ļ╣Ćņłśņ¦ä, ŃĆīĒĢ£ĻĄŁ ļ┤ēĒÖ® ļ¼Ėņן(ń┤ŗń½Ā)ņØś ĻĖ░ņøÉĻ│╝ ņĀĢņ╣śĒĢÖ-ņ░ĮļŹĢĻČü ņØĖņĀĢņĀä <ļ┤ēĒÖ®ļÅä>ņŚÉņä£ ņ▓ŁņÖĆļīĆ ļ┤ēĒÖ® ļ¼ĖņןĻ╣īņ¦ĆŃĆŹ, ŃĆÄĒĢ£ĻĄŁĒĢÖ, ĻĘĖļ”╝Ļ│╝ ļ¦īļéśļŗżŃĆÅ (Ēā£ĒĢÖņé¼, 2013); Ļ╣ĆĒśäņ¦Ć, ŃĆīļÅÖņĢäņŗ£ņĢä ņ£ĀĻĄÉņé¼ĒÜīņØś ņØ┤ņāüņĀü ņØ┤ļ»Ėņ¦Ć ļ┤ēĒÖ®ŃĆŹ, ŃĆÄĻĮāĻ│╝ ļÅÖļ¼╝ļĪ£ ļ│Ė ņäĖņāüŃĆÅ (ņé¼ĒÜīĒÅēļĪĀ, 2021), pp. 16-55. ļō▒ņØ┤ ņ׳ļŗż.
23) ņØ╝ļ│ĖņŚÉņä£ ļ┤ēĒÖ®ņØĆ ņ▓£ĒÖ®Ļ│╝ ĒÖ®ņŗżņØä ņāüņ¦ĢĒĢśļŖö ļ¼Ėņ¢æņ£╝ļĪ£ ņé¼ņÜ®ļÉśņŚłļŗż. 20ņäĖĻĖ░ ņ┤ł ĒØöĒĢśĻ▓ī ļ░£Ē¢ēļÉ£ ņØ╝ļ│Ė ĒÖ®ņĪ▒ļōżņØś ņé¼ņ¦äĻ│╝ ĻĖ░ļĪØņØ┤ ņØĖņćäļÉ£ <ńÜ浌ÅńĢ½ÕĀ▒>ņŚÉ ļ┤ēĒÖ®ņØ┤ ņןņŗØļÉśņŚłļŗż. https://www.gogung.go.kr ņØś ņåīņןĒÆł Ļ│ĀĻČü 574 ņ░ĖĻ│Ā.
24) ņØ╝ļ│ĖņØś ņ╣Āļ│┤Ļ│ĄņśłļŖö ĻĖł, ņØĆ, ĻĄ¼ļ”¼, ņ▓ŁļÅÖ ļō▒ņØś ĻĖłņåŹ ļ░öĒāĢņŚÉ ņ£ĀņĢĮņØä 800Ōäā ņĀäĒøä Ļ│Āņś©ņŚÉņä£ ņåīņä▒ĒĢśņŚ¼ ļģ╣ņØĖ Ēøä ņ£Āļ”¼ Ēś╣ņØĆ ņŚÉļéśļ®£ņØä ņØ┤ņÜ®ĒĢśņŚ¼ ņ▒äņāēņØä ņ×ģĒśĆ ņĀ£ņ×æĒ¢łņ£╝ļ®░, ņ¢ćņØĆ ĻĖłņåŹņäĀņ£╝ļĪ£ ļ¬©ņ¢æņØä ļé┤ļŖö ņ£ĀņäĀ ņ╣Āļ│┤ņÖĆ ņ╣Āļ│┤ ņ£ĀņĢĮ ņé¼ņØ┤ņŚÉ ĻĖłņåŹņäĀņØä ļČÖņØ┤ņ¦Ć ņĢŖĻ│Ā ļ¬©ņ¢æņØä ļé┤ļŖö ļ¼┤ņäĀ ņ╣Āļ│┤ļĪ£ ĻĄ¼ļČäļÉ£ļŗż. ŃĆīõĖāÕ«ØŃĆŹ, ŃĆĵŚźµ£¼Ńü«ńŠÄĶĪōŃĆÅ 3(Ķć│µ¢ćÕĀé, 1993), p. 322.
25) ņØ╝ļ│Ė ļ│æĒÆŹņØĆ ņĪ░ņäĀ ņ┤łļČĆĒä░ ņØ╝ņĀ£Ļ░ĢņĀÉĻĖ░Ļ╣īņ¦Ć ĻŠĖņżĆĒ׳ ņ£Āņ×ģļÉśņŚłļŗż. ĒŖ╣Ē׳, ņ×äņ¦äņÖ£ļ×Ćņ£╝ļĪ£ ĒĢ£ņØ╝ ņÖĖĻĄÉ Ļ┤ĆĻ│äĻ░Ć ļŗ©ņĀłļÉśņŚłļŗżĻ░Ć ĻĄŁĻĄÉĻ░Ć ĒÜīļ│ĄĒĢ£ 17ņäĖĻĖ░ ņ┤łļČĆĒä░ ņĪ░ņäĀ ņÖĢņŗżņŚÉ ņ£Āņ×ģļÉ£ ņØ╝ļ│Ė ļ│æĒÆŹņØś ņłśļŖö Ēü¼Ļ▓ī ņ”ØĻ░ĆĒĢśņśĆļŗż. Ļ╣Ćņłśņ¦ä, ŃĆīņĪ░ņäĀ ņÖĢņŗżņŚÉņä£ņØś ņÖ£ņןļ│æĒÆŹ ņĀ£ņ×æĻ│╝ ĻĘĖ ļ¼ĖĒÖöņé¼ņĀü ņØśņØśŃĆŹ, ŃĆÄļ»ĖņłĀņé¼ņÖĆ ņŗ£Ļ░üļ¼ĖĒÖöŃĆÅ 23(2019), pp. 12-16.
26) ņØ╝ļ│ĖņØś ņłśņČ£ņÜ® ņ×Éņłś ļ│æĒÆŹņŚÉ Ļ┤ĆĒĢśņŚ¼ Ļ╣Ćņłśņ¦ä, ŃĆīĻĘ╝ļīĆ ņĀäĒÖśĻĖ░ ņĪ░ņäĀ ņÖĢņŗżņŚÉ ņ£Āņ×ģļÉ£ ņØ╝ļ│Ė ņ×Éņłś ļ│æĒÆŹŃĆŹ, ŃĆÄļ»ĖņłĀņé¼ļģ╝ļŗ©ŃĆÅ 36(2013), pp. 91-116ņ░ĖņĪ░.
27) ņ░ĮļŹĢĻČüņØä ņżæņŗ¼ņ£╝ļĪ£ ņĀäņäĖļÉśĻ│Ā ņ׳ļŖö ĻĘ╝ļīĆ ņØ╝ļ│Ė ņ×Éņłś ļ│æĒÆŹņØĆ Ļ│ĄĻ░äņØś ļ░░Ļ▓Į ņןņŗØņ£╝ļĪ£ ĒÜ©Ļ│╝ņĀüņØ┤ņŚłļŹś ĻĮāĻ│╝ ņāłļź╝ ĒÖöņ×¼(ńĢ½µØÉ)ļĪ£ ĒĢ£ Ļ▓āņØ┤ ļ¦ÄņĢśļŗż. ļīĆĒæ£ ņ×æĒÆłņ£╝ļĪ£ļŖö https://www.gogung.go.kr/ ņ£Āļ¼╝ļ▓łĒśĖ ņ░ĮļŹĢ6600 <ĻĄŁņ×æļÅä(ĶÅŖķøĆÕ£¢) ņ×Éņłś ļ│æĒÆŹ> ņ░ĖĻ│Ā.
28) 1900ļģäļīĆ ņØ╝ļ│Ė ļ│æĒÆŹņØ┤ ĒÖ®ņŗżņŚÉ ņ¦äĒŚīļÉśļŖö ņØ╝ņØ┤ ļ¦ÄņĢśļŗż. ŃĆÄńÜćդĵ¢░Ķü×ŃĆÅ 1908ļģä 10ņøö 25ņØ╝; ŃĆÄņł£ņóģņŗżļĪØļČĆļĪØŃĆÅņØś 1911ļģä 5ņøö 12ņØ╝, 1915ļģä 10ņøö 6ņØ╝, 1917ļģä 6ņøö 19ņØ╝, 1920ļģä 6ņøö 3ņØ╝ ļō▒ņØś ĻĖ░ļĪØņØä ĒåĄĒĢ┤ ņØ╝ļ│Ė ļ│æĒÆŹņØś ņ£Āņ×ģ ņāüĒÖ®ņØä ĒÖĢņØĖĒĢĀ ņłś ņ׳ļŗż.
29) Fig. 8. <ņł£ņóģĒÖ®ņĀ£ņØś ņØśņ×É>ļŖö <ņł£ņóģņ┤łņāüņé¼ņ¦ä>(1909)Ļ│╝ <ņ░ĮļŹĢĻČü ņØĖņĀĢņĀä ļÅÖĒ¢ēĻ░ü> ņé¼ņ¦äņŚÉņä£ ĒÖĢņØĖļÉśļ®░, ĻĄŁļ”ĮĻ│ĀĻČüļ░Ģļ¼╝Ļ┤Ć ņåīņןĒÆł ņ£Āļ¼╝ļ▓łĒśĖ ĻĖ░ĒāĆ5ņÖĆ ļ¼ĖĒÖöņ×¼ņ▓Ł ņ░ĮļŹĢĻČüĻ┤Ćļ”¼ņåī, ņĢ×ņØś ņ▒ģ, p. 11 <õ╗üµö┐µ«┐µØ▒ĶĪīķ¢ŻõĖŖÕ▒żõ╝æµå®Õ«ż> ņ░ĖņĪ░.
30) ŃĆĵØÄńÄŗÕ«Čń┤ĆÕ┐ĄÕ»½ń£×ÕĖ¢ŃĆÅ (1919)ņŚÉļŖö <ņØ┤ĒÖöļ┤ēĒÖ®ļ¼ĖņĢöņ▓┤ņ¢┤>ņŚÉ ņĢēņĢäņ׳ļŖö ņł£ņóģ ļé┤ņÖĖ ņ┤łņāüņé¼ņ¦äņØ┤ ņŗżļĀżņ׳ļŗż. https://www.gogung.go.kr/ ņ£Āļ¼╝ļ▓łĒśĖ Ļ│ĀĻČü770 ņ░ĖņĪ░.
31) µ£Øķ««ÕÅżÕ╝ÅņŚÉ õĮøÕ£ŗÕ╝ÅņØä ÕŖĀÕæ│ĒĢ£ µśīÕŠĘÕ«« Õģ¦ Õż¦ķĆĀµ«┐, ŌĆ”. ŃĆĵ»ÅµŚźńö│ÕĀ▒ŃĆÅ, 1920ļģä 10ņøö 13ņØ╝.
32) ņĄ£ņ¦ĆĒś£, ŃĆīĻĘ╝ļīĆ ņĀäĒÖśĻĖ░ ĻČüĻČÉņŚÉ ņ£Āņ×ģļÉ£ Ēöäļ×æņŖżņŗØ ņŗżļé┤ņןņŗØĻ│╝ Ļ░ĆĻĄ¼ŃĆŹ, ŃĆÄĻ│ĀĻČüļ¼ĖĒÖöŃĆÅ 12(2019), pp. 51-59.
33) ņÖĖĒśĢņØĆ ņĪ░ņäĀņŗØņØ┤ņ¦Ćļ¦ī ļé┤ļČĆ Ļ│ĄĻ░äņØ┤ ņä£ņ¢æņŗØņ£╝ļĪ£ ņןņŗØļÉ£ ĒĢ£ņ¢æ(ķ¤ōµ┤ŗ) ņĀłņČ®ņŗØ ņĀäĻ░üņ£╝ļĪ£ļŖö 1908ļģä Ļ░£ņĪ░ļÉ£ ņ░ĮļŹĢĻČü ņØĖņĀĢņĀä, 1912ļģä ņżĆĻ│ĄļÉ£ ļŹĢņłśĻČü ļŹĢĒÖŹņĀä(ÕŠĘÕ╝śµ«┐), ĻĘĖļ”¼Ļ│Ā 1920ļģä ņ×¼Ļ▒┤ļÉ£ ņ░ĮļŹĢĻČü ļīĆņĪ░ņĀä, ĒؼņĀĢļŗ╣ ņĀĢļÅäņØ┤ļŗż.
34) ļīĆņĪ░ņĀäņØĆ µØÄńÄŗÕÉīÕ”āÕģ®µ«┐õĖŗņØś ÕŠĪĶĄĘÕ▒ģĒĢśļŖö Õ««Õ«żņØ┤ļŗż. ŌĆ” µÄźĶ”ŗÕ«ż ŌĆ” ņĀĢļ®┤ņŚÉļŖö ķ╗ā’żŖµ×ĀņØś ļŗ╣ņ┤łļ¼Ėņ¢æņØś ÕĆÜÕŁÉĻ░Ć õ║īĶäÜ ÕÉ䵩ŻĶē▓ÕĮ®õĖŁņŚÉ ńć”ńäČĒ׳ ÕģēĶ╝Øļź╝ ļ░£ĒĢśņŚ¼ ŌĆ” (ņżæļץ). ŃĆīĶ”▓Ķ”ŗÕäĆļź╝ ĶĪīĒĢśņśĄņŗż Õż¦ķĆĀµ«┐ µŗ£Ķ¦ĆĶ©śŃĆŹ, ŃĆĵ»ÅµŚźńö│ÕĀ▒ŃĆÅ, 1922ļģä 4ņøö 26ņØ╝.
35) ĻĘ╝ļīĆ ņĀäĒÖśĻĖ░ņØś ĻČüĻČÉņØä ņżæņŗ¼ņ£╝ļĪ£ ļé©ņĢäņ׳ļŖö ņä£ņ¢æ Ļ░ĆĻĄ¼ ļ░Å ņןņŗØņŚÉ ļīĆĒĢ£ ņŚ░ĻĄ¼ļĪ£ ņĄ£ņ¦ĆĒś£, ŃĆīĻĘ╝ļīĆ ņĀäĒÖśĻĖ░ ņŗżļé┤Ļ│ĄĻ░äĻ│╝ ņä£ņ¢æ Ļ░ĆĻĄ¼ņŚÉ ļīĆĒĢ£ Ļ│Āņ░░: ņäØņĪ░ņĀäņØä ņżæņŗ¼ņ£╝ļĪ£ŃĆŹ (ĻĄŁļ»╝ļīĆĒĢÖĻĄÉ ļ»ĖņłĀĒĢÖĻ│╝ ļ░Ģņé¼ĒĢÖņ£äļģ╝ļ¼Ė, 2018);, ŃĆī20ņäĖĻĖ░ ņ┤ł ļŹĢņłśĻČü┬Ęņ░ĮļŹĢĻČüņŚÉ ņ£Āņ×ģļÉ£ ļ”¼ļåĆļź©(Linoleum) ļ░öļŗźņ×¼ ņŚ░ĻĄ¼: ļ”¼ļåĆļź©ņØś ņĀ£ņ×æ ļ░®ņŗØĻ│╝ ĒŖ╣ņä▒ ļ░Å ņé¼ņÜ®ņØä ņżæņŗ¼ņ£╝ļĪ£ŃĆŹ, ŃĆĵ¢ćÕī¢Ķ▓ĪŃĆÅ 54 1ĒśĖ(2021), pp. 18-31. ņ░ĖņĪ░.
36) Ēśäņ×¼ ļīĆņĪ░ņĀä ļīĆņ▓ŁĻ│╝ ĒؼņĀĢļŗ╣ ņĀæĻ▓¼ņŗżņŚÉļŖö ņĢöņ▓┤ņ¢┤, ņä£ņ¢æņŗØ ņןņØśņ×ÉņØĖ ņäĖĒŗ░(settee) ļō▒ ļĪ£ņĮöņĮö ņ¢æņŗØņØś ņä£ņ¢æ ņØśņ×ÉļōżņØ┤ ļé©ņĢäņ׳ļŗż.
37) ļīĆņĪ░ņĀä ņ¢æĻ┤ĆņØĆ 1917ļģä ļīĆņĪ░ņĀäņØś ĒÖöņ×¼ļĪ£ Ļ│Ąņé¼Ļ░Ć ņżæļŗ©ļÉśņ¢┤ ĒśäņĪ┤ĒĢśļŖö Ļ▒┤ņČĢļ¼╝ņØĆ ņĢäļŗłļŗż. <Õ««ķŚĢµ┤ŗķż©µćēµÄźÕ«ż ņŖżņ╝Ćņ╣ś>ļŖö ņ¦Ćļ®┤ņāü ļööņ¦ĆĒäĖ ņןņä£Ļ░ü ņ▓ŁĻĄ¼ĻĖ░ĒśĖ RD04504 ņ░ĖņĪ░. https://jsg.aks.ac.kr/
38) 1908ļģä Ļ░£ņĪ░ļÉ£ ņØĖņĀĢņĀä ņŗżļé┤ ņ░ĮĻ│╝ ņ╗żĒŖ╝ ņןņŗØņØĆ ļ¼ĖĒÖöņ×¼ņ▓Ł ņ░ĮļŹĢĻČüĻ┤Ćļ”¼ņåī, ņĢ×ņØś ņ▒ģ, p. 24ņØś <ņØĖņĀĢņĀäļÅÖĒ¢ēĻ░üļé┤ļČĆ> ņ░ĖņĪ░.
39) ĻĄŁļ”ĮĻ│ĀĻČüļ░Ģļ¼╝Ļ┤ĆņŚÉ ņåīņןļÉ£ Ļ░ĆĻĄ¼ ņØ╝ļČĆņŚÉļŖö ļŹĢņłśĻČü ļÅłļŹĢņĀäņŚÉņä£ ņé¼ņÜ®ļÉśļŗżĻ░Ć ņ░ĮļŹĢĻČü ļīĆņĪ░ņĀä ņśüņŚŁņ£╝ļĪ£ ņØ┤ņĀäļÉśņŚłļŗżļŖö Ēæ£ņŗØņØ┤ ļČĆņ░®ļÉśņ¢┤ ņ׳ņ¢┤ ņØ┤ļÅÖņØ┤ ņÜ®ņØ┤ĒĢ£ Ļ░ĆĻĄ¼ļōżņØś ņé¼ņÜ®ņ▓śĻ░Ć ļ│ĆĒÖöĒĢ£ ņĀĢĒÖ®ņØä ĒÖĢņØĖĒĢĀ ņłś ņ׳ļŗż.
40) ĒÄśļØ╝ļéśņ╣ĖņØĆ ļ¦ÉļĀłņØ┤ļ░śļÅäļź╝ ņżæņŗ¼ņ£╝ļĪ£ ņØ┤ņŻ╝ĒĢ£ ņżæĻĄŁņØĖĻ│╝ Ēśäņ¦ĆņØĖ ņé¼ņØ┤ņŚÉ Ēā£ņ¢┤ļé£ ņżæĻĄŁņØĖ ĒøäņåÉņ£╝ļĪ£ ņ▓ŁļīĆņŚÉ ļÅÖļé©ņĢäņŗ£ņĢäņÖĆ ņżæĻĄŁņØä ņ×ćļŖö ļ¼┤ņŚŁņØä ņŻ╝ļÅäĒĢśļ®┤ņä£ ļÅģĒŖ╣ĒĢ£ ļ¼ĖĒÖöļź╝ ļ¦īļōżņ¢┤ļāłļŗż. Jesse Russell, Peranakan (Edinburgh : Book on Demand, 2012), pp. 8-10.
41) ļīĆņĪ░ņĀäņØś ņżæĻĄŁ Ļ░ĆĻĄ¼ņØś ĒśäĒÖ®ņØĆ <ļéśņĀäĒāæņāü> 1ņĀÉ, <Ēā£ņé¼ņØś> 4ņĀÉ, <ļ░®ļō▒> 1ņĀÉ, <ļéśņĀäņ▓┤Ļ▓Į> 1ņĀÉ, <ņīŹņÜ®ņןņŗØņØśņ×É> 2ņĀÉ, <ņøÉĒśĢĒāüņ×É> 1ņĀÉ, <ļ░®ĒśĢĒāüņ×É> 1ņĀÉņØ┤ļŗż.
42) Ronald G.Knapp, The Peranakan Chinese Home : Art and Culture in Daily Life (Tokyo : Tuttle Publishing, 2012), pp. 76-81.
43) <ļ¬®ņĀ£ņ╣©ļīĆ>ļŖö ļ│┤ņłśņŗ£ņŚÉ ĒöäļĀłņ×äņØĆ ņżæĻĄŁ ņ▓ŁļīĆņØś Ļ▓āņØ┤ļéś ņŖżĒöäļ¦üĻ│╝ ņøÉļŗ©ņØĆ ņØ╝ļ│ĖņŚÉņä£ ņłśņ×ģĒĢśņśĆņ£╝ļ®░, ļé┤ļČĆ ņĪ░ļ”Įņŗ£ ņé¼ņÜ®ĒĢ£ ņ£ĪņåĪņØĆ ĻĄŁļé┤ņé░ņØ┤ļØ╝Ļ│Ā ņĪ░ņé¼ļÉ£ ļ░ö ņ׳ļŗż. ņŚÉņØ┤ņŖż ņ╣©ļīĆ, ŃĆÄņ░ĮļŹĢĻČü ļīĆņĪ░ņĀä ņ╣©ļīĆ ļ│ĄņøÉļ│┤Ļ│Āņä£ŃĆÅ (ļ¼ĖĒÖöņ×¼ņ▓Ł, 2009) ņ░ĖņĪ░.
44) ņżæĻĄŁ ņ▓Ł(µĘĖ)ļéśļØ╝ņØś ĒÖ®ņŗż ĻČüĻČÉņØ┤ņŚłļŹś ņŗ¼ņ¢æ Ļ│ĀĻČüņØś ņłŁņĀĢņĀäņØĆ ņ▓Ł ĒÖ®ņĀ£ņØś Ļ│ĄņŗØ ņŚģļ¼┤Ļ│ĄĻ░äņ£╝ļĪ£ ņé¼ņÜ®ļÉśņŚłņ£╝ļ®░, ļé┤ļČĆņŚÉļŖö ļ│┤ņóīļź╝ ņżæņŗ¼ņ£╝ļĪ£ ņ¢æ ņ¬ĮņŚÉ Ļ▒┤ļźŁ ļģäĻ░ä(1735~1796) ņĀ£ņ×æļÉ£ ļ▓Ģļ×æĒ¢źļĪ£ 1ņīŹņØ┤ ņןņŗØļÉśņŚłļŗż.
45) Ļ╣ĆņØĆĻ▓Į, ŃĆī19ņäĖĻĖ░ ņĪ░ņäĀņÖĢņŗż ņåīņÜ® µĘĖõ╗Ż ķćēõĖŖÕĮ® ńōĘÕÖ© ņŚ░ĻĄ¼ŃĆŹ, ŃĆÄĻ░Ģņóīļ»ĖņłĀņé¼ŃĆÅ 46(2016), pp. 135-147.
46) ĻČüĻČÉņŚÉ ņĀäņäĖļÉśļŖö ņןņŗØņÜ® ĒÄśļØ╝ļéśņ╣Ė ņ¢æņŗØņØś ļ▓Ģļ×æņ×ÉĻĖ░ļŖö ĻĄŁļ”ĮĻ│ĀĻČüļ░Ģļ¼╝Ļ┤Ć, ŃĆĵ¢░ ņÖĢņŗżļÅäņ×ÉŃĆÅ (ĻĄŁļ”ĮĻ│ĀĻČüļ░Ģļ¼╝Ļ┤Ć, 2020), pp. 191-195ņØś ļÅäĒīÉ 82-86 ņ░ĖĻ│Ā.
47) Ļ░üņŻ╝ 29ņŚÉņä£ ņ¢ĖĻĖēĒĢ£ <ņł£ņóģņ┤łņāüņé¼ņ¦ä>ņŚÉņä£ļÅä ņ¢æĻĖ░ĒøłņØś <ļ¦żĒÖöļÅä ņ×Éņłś ļ│æĒÆŹ>ņØ┤ ņé¼ņ¦äņØś ļ░░Ļ▓ĮņØ┤ņ×É ņןņŗØņ£╝ļĪ£ ĒÖ£ņÜ®ļÉśņŚłļŗż.
48) ĻČüņżæņŚÉ ĒŚīņāüļÉ£ ĒÖöĻ░ĆņØś Ļ┤Ćņä£Ļ░Ć ņ׳ļŖö ņ×Éņłś ļ│æĒÆŹņØĆ ņ¢æĻĖ░ĒøłĻ│╝ Ļ╣ĆĻĘ£ņ¦äņØś ņ×æĒÆłņØ┤ ņ׳ņ£╝ļ®░, ņ¢æĻĖ░ĒøłĻ│╝ Ļ╣ĆĻĘ£ņ¦äņØĆ ņ×Éņłś Ļ│ĄņśłĻ░Ć ļ░£ļŗ¼Ē¢łļŹś ĒÅēņ¢æ ņČ£ņŗĀņØ┤ņŚłļŗż. ņ¢æĻĖ░ĒøłĻ│╝ Ļ╣ĆĻĘ£ņ¦äņØĆ ĒÅēņ¢æ ņČ£ņŗĀ ĒÖöĻ░ĆļĪ£ņä£ ĒÅēņĢłļÅä ņĢłņŻ╝ ņ¦ĆņŚŁņØś ņ×Éņłś Ļ│ĄņśłņŚÉ ļīĆĒĢ┤ ņל ņĢīĻ│Ā ņ׳ņŚłĻ│Ā, ņØ┤ņŚÉ ļö░ļØ╝ ņØ┤ļōżņØś ĻĘĖļ”╝ņØä ļ│Ėņ£╝ļĪ£ ĒĢ£ ņ×Éņłś ļ│æĒÆŹņØ┤ ņĀ£ņ×æļÉśņŚłņØä Ļ▓āņ£╝ļĪ£ ņČöņĀĢļÉ£ļŗż.
49) ĻĘ╝ļīĆ Ļ│ĄņśłņÖĆ ļÅäņĢł(Õ£¢µĪł)ņŚÉ ļīĆĒĢ£ ņäĀĻĄ¼ ņŚ░ĻĄ¼ļĪ£ ņĄ£Ļ│ĄĒśĖ, ŃĆÄņé░ņŚģĻ│╝ ņśłņłĀņØś ĻĖ░ļĪ£ņŚÉņä£ŃĆÅ (ļ»ĖņłĀļ¼ĖĒÖö, 2008) ņ░ĖņĪ░.
50) <ļ¦żĒÖöļÅä ņ×Éņłś ļ│æĒÆŹ>ņØĆ ņŗżņØś Ļ╝¼ņ×äņØ┤ ļæÉĒģüĻ│Ā, ņåŹņłśļź╝ ĒÖ£ņÜ®ĒĢśņŚ¼ ņ×ģņ▓┤Ļ░ÉņØä Ļ░ĢĒĢśĻ▓ī Ēæ£ĒśäĒ¢łļŹś ņĢłņŻ╝ņłś(Õ«ēÕĘ×ń╣Ī)ļĪ£ ņĀ£ņ×æļÉśņ¢┤ ņןņŗØņĀü ĒÜ©Ļ│╝Ļ░Ć ļŹöņÜ▒ ļø░ņ¢┤ļé¼ļŗż. ļ░Ģņ£żĒؼ, ŃĆīĻČüņżæ ņ×ÉņłśņØś ņĀäĒåĄĻ│╝ ĒÖöņøÉņØś ņłśļ│Ė ņĀ£ņ×æŃĆŹ, ŃĆÄņĢäļ”äļŗżņÜ┤ ĻČüņżæ ņ×ÉņłśŃĆÅ (ĻĄŁļ”ĮĻ│ĀĻČüļ░Ģļ¼╝Ļ┤Ć, 2013), p. 204.
51) Ļ╣ĆĻĘ£ņ¦äņØś <ń½╣ń¤│Õ£¢ ļ│æĒÆŹ>ņØĆ ĻĄŁļ”ĮĻ│ĀĻČüļ░Ģļ¼╝Ļ┤Ć, ŃĆÄĻČüņżæņä£ĒÖöIŃĆÅ (ĻĄŁļ”ĮĻ│ĀĻČüļ░Ģļ¼╝Ļ┤Ć, 2012), pp. 244-245ņØś ļÅäĒīÉ 155, Ļ╣ĆņØæņøÉņØś <ĶśŁń¤│Õ£¢ ļ│æĒÆŹ>ņØĆ pp. 248-249ņØś ļÅäĒīÉ 157, Ļ░Ģņ¦äĒؼņØś <ķŹŠķ╝Äńō”ÕĪ╝ķŖśĶ橵©ĪÕ£¢ ļ│æĒÆŹ>ņØĆ pp. 258-259ņØś ļÅäĒīÉ 164 ņ░ĖņĪ░.
52) ņ░ĮļŹĢĻČüņŚÉ ņĀäĒĢśļŖö ļīĆĒśĢņØś ņןņŗØņÜ® ņä£ĒÖö ļ│æĒÆŹņØĆ 1917ļģä ņ░ĮļŹĢĻČü ĒÖöņ×¼ ņØ┤Ēøä ņ░ĮļŹĢĻČüņŚÉ ļ░░ņäżĒĢĀ ļ│æĒÆŹ ļ░Å ĻĖ░ļ¼╝ ļō▒ņØ┤ ņ¦äņāüļÉśņŚłļŹś ņé¼ņŗżĻ│╝ Ļ┤ĆļĀ© ņ׳ņŚłļŗż. Ļ░Ģļ»╝ĻĖ░, ŃĆīņĀ£ĻĄŁņØä Ļ┐łĻŠĖņŚłļŹś ņĀäĒÖśĻĖ░ņØś ĒÖöļŗ©ŃĆŹ, ŃĆÄņÖĢĻ│╝ ĻĄŁĻ░ĆņØś ĒÜīĒÖöŃĆÅ (ļÅīļ▓ĀĻ░£, 2011), p. 298.
53) ņ░ĮļŹĢĻČüņŚÉļŖö Ļ░Ģņ¦äĒؼ, Ļ╣ĆĻĘ£ņ¦ä, Ļ╣ĆņØĆĒśĖ, Ļ╣ĆņØæņøÉ, ņĢłņżæņŗØ, ņ¢æĻĖ░Ēøł, ņØ┤ļÅäņśü, ņØ┤ĒĢ£ļ│Ą, ņĀĢĒĢÖĻĄÉ, ņĪ░ņäØņ¦ä ļō▒ņØś ņ×æĒÆłļōżņØ┤ 1980ļģä ļ░£Ļ▓¼ļÉśņŚłņ£╝ļ®░, Ēśäņ×¼ ņ┤Ø 34ņĀÉņØ┤ ņĀäĒĢśļ®░, ĻĄŁļ”ĮĻ│ĀĻČüļ░Ģļ¼╝Ļ┤ĆņŚÉ ņåīņןļÉśņ¢┤ ņ׳ļŗż. ļ¼ĖĒÖöņ×¼Ļ┤Ćļ”¼ĻĄŁ, ŃĆÄÕ««┬ĘķÖĄµēĆĶŚÅķü║ńē®ńø«’ż┐ŃĆÅ (ļ¼ĖĒÖöņ×¼Ļ┤Ćļ”¼ĻĄŁ, 1980) ņ░ĖņĪ░.
54) ņĪ░ņØĆņĀĢ, ŃĆī1920ļģä ņ░ĮļŹĢĻČü ļ▓ĮĒÖö ņĪ░ņä▒ņŚÉ ļīĆĒĢ£ ņŚ░ĻĄ¼ŃĆŹ, ŃĆÄļ»ĖņłĀņé¼ĒĢÖļ│┤ŃĆÅ 33(2009); ļ¼ĖĒÖöņ×¼ņ▓Ł ņ░ĮļŹĢĻČüĻ┤Ćļ”¼ņåī, ŃĆÄņ░ĮļŹĢĻČü ĒؼņĀĢļŗ╣ ļČĆļ▓ĮĒÖö ļ¬©ņé¼ļÅä ņĀ£ņ×æ ļ│┤Ļ│Āņä£ŃĆÅ (ļ¼ĖĒÖöņ×¼ņ▓Ł, 2009) ņ░ĖņĪ░.
55) ņØ┤ņÖĢņ¦üņØś Ļ│żļÅä ņŗ£ļĪ£ņŖżņ╝ĆļŖö ņĪ░ņäĀ ĒÖöĻ░Ćļź╝ ņé¼ĒÜīļĪ£ļČĆĒä░ ņØĖņĀĢļ░øĻ▓ī ĒĢśĻ│Ā, ĻĘĖļōżņŚÉĻ▓ī ņāØĒÖ£ņ×ÉĻĖłņØä ņ¦ĆņøÉĒĢĀ ņłś ņ׳ļŖö ĻĖ░ĒÜīļØ╝Ļ│Ā ņāØĻ░üĒĢśņŚ¼ ņł£ņóģņŚÉĻ▓ī Ļ▒┤ņØśĒ¢łĻ│Ā, ņł£ņóģļÅä ņØ┤ņŚÉ Ēü¼Ļ▓ī ļ¦īņĪ▒ĒĢ£ļŗżĻ│Ā ĒĢśņśĆļŗż. Ļ│żļÅä ņŗ£ļĪ£ņŖżņ╝Ć(µ¼ŖĶŚżÕøøķā×õ╗ŗ), ņØ┤ņ¢ĖņłÖ ņŚŁ, ŃĆÄļīĆĒĢ£ņĀ£ĻĄŁ ĒÖ®ņŗżļ╣äņé¼ŃĆÅ (ņØ┤ļ¦łĻ│Ā, 2007), p. 302.
56) Ļ╣ĆĻĘ£ņ¦äņØś ĻĖłĻ░Ģņé░ļÅäņÖĆ Ļ┤ĆļĀ©ĒĢśņŚ¼ ņØ┤ņśüņłś, ŃĆī20ņäĖĻĖ░ ņ┤ł µØÄńÄŗÕ«Č Ļ┤ĆļĀ© ķćæÕēøÕ▒▒Õ£¢ ńĪÅń®ČŃĆŹ, ŃĆÄļ»ĖņłĀņé¼ĒĢÖņŚ░ĻĄ¼ŃĆÅ 271┬Ę272(2011), pp. 205-236ņ░ĖņĪ░.
57) Ļ╣ĆĻĘ£ņ¦äņØś <ĻĖłĻ░Ģņé░ļ¦īļ¼╝ņ┤łņŖ╣Ļ▓ĮļÅä>ļŖö ĻĄŁļ”ĮĻ│ĀĻČüļ░Ģļ¼╝Ļ┤Ć, ŃĆÄņ░ĮļŹĢĻČü ĒؼņĀĢļŗ╣ ļ▓ĮĒÖö ĒŖ╣ļ│äņĀä ļÅäļĪØŃĆÅ (ĻĄŁļ”ĮĻ│ĀĻČüļ░Ģļ¼╝Ļ┤Ć, 2017), p. 44 ļÅä 1 ņ░ĖņĪ░.
58) Ļ╣ĆņØĆĒśĖņØś <ļ░▒ĒĢÖļÅä>ļŖö ĻĄŁļ”ĮĻ│ĀĻČüļ░Ģļ¼╝Ļ┤Ć, ŃĆÄņ░ĮļŹĢĻČü ļīĆņĪ░ņĀä ļ▓ĮĒÖöŃĆÅ (ĻĄŁļ”ĮĻ│ĀĻČüļ░Ģļ¼╝Ļ┤Ć, 2015), pp. 28-29, ņśżņØ╝ņśü, ņØ┤ņÜ®ņÜ░ņØś <ļ┤ēĒÖ®ļÅä>ļŖö pp. 18-19, ņØ┤ņāüļ▓öņØś <ņé╝ņäĀĻ┤ĆĒīīļÅä>ļŖö pp. 70-71, ļģĖņłśĒśäņØś <ņĪ░ņØ╝ņäĀĻ┤ĆļÅä>ļŖö pp. 62-63ņ░ĖņĪ░.
59) ņĪ░ņäĀņé¼ļ×īņØś ļ»ĖņłĀņØä ņłŁņāüĒĢśļ®░ Ļ▓ĖĒĢśņŚ¼ ņĀäĒĢśņØś ĒÅēņāØ ņĢĀĒśĖĒĢśņŗ£ļŖö ļ│Ėņ¦ĆņŚÉ ņ¢┤Ļ╣ĆņØ┤ ņŚåĻ│Āņ×É ĒĢ£ļŗż. ŃĆÄļÅÖņĢäņØ╝ļ│┤ŃĆÅ, 1920ļģä 6ņøö 24ņØ╝.
60) ņł£ņĀĢĒÜ©ĒÖ®Ēøä(1894~1966)ļŖö ņØ╝ņĀ£Ļ░ĢņĀÉĻĖ░ ņł£ņóģĻ│╝ ĒĢ©Ļ╗ś ņ░ĮļŹĢĻČü ļīĆņĪ░ņĀäņŚÉņä£ ļ©Ėļ¼╝ļĀĆņ£╝ļ®░, ņł£ņóģĒÖ®ņĀ£Ļ░Ć 1926ļģä ņé¼ļ¦ØĒĢ£ ĒøäņŚÉļŖö ļīĆļ╣ä(Õż¦Õ”ā)ļĪ£ ņ░ĮļŹĢĻČü ļéÖņäĀņ×¼ņŚÉ ĻĖ░Ļ▒░ĒĢśņśĆļŗż. ņł£ņĀĢĒÜ©ĒÖ®ĒøäņØś ņ░ĮļŹĢĻČü Ļ░ĆĻĄ¼ļŖö ļÅÖņĢäļīĆĒĢÖĻĄÉ ņäØļŗ╣ļ░Ģļ¼╝Ļ┤Ć ņé¼ņØ┤ĒŖĖ ņ░ĖĻ│Ā. http://museum.donga.ac.kr/
61) ļÅÖņĢäļīĆĒĢÖĻĄÉ ņäØļŗ╣ļ░Ģļ¼╝Ļ┤Ć ņåīņןņØś ņł£ņĀĢĒÜ©ĒÖ®Ēøä Ļ░ĆĻĄ¼ņØś <ĻĖłĻ░Ģņé░ļÅä> ļÅäņĢłĻ│╝ Ļ┤ĆļĀ©ĒĢśņŚ¼ ņØ┤ņśüņłś, ņĢ×ņØś ļģ╝ļ¼Ė, pp. 221-229ņ░ĖņĪ░.
62) Ļ╣Ćņ¦äĻ░æņØĆ ņØ┤ņÖĢņ¦üļ»ĖņłĀĒÆłņĀ£ņ×æņåī ļéśņĀäļČĆņŚÉņä£ ĒÖ£ļÅÖĒĢ£ ļ░ö ņ׳Ļ│Ā, ņĪ░ņäĀļ»ĖņłĀņĀäļ×īĒÜīņŚÉņä£ ļéśņĀäņ╣ĀĻĖ░ļĪ£ ļŗżņłś ņ×ģņāüĒĢ£ ĻĘ╝ļīĆ Ļ│ĄņśłĻ░ĆņśĆĻĖ░ ļĢīļ¼ĖņŚÉ ļÅäņĢłņØä ņ×æĒÆłņŚÉ ņĀüĻĘ╣ņĀüņ£╝ļĪ£ ĒÖ£ņÜ®ĒĢĀ ņłś ņ׳ņŚłļŗż. ņĄ£Ļ│ĄĒśĖ, ŃĆīĻ╣Ćņ¦æĻ░æņØś ļéśņĀäņ╣©ļīĆ-ņé¼ņÜ®ņ×ÉņÖĆ ņĀ£ņ×æĻ▓Įņ£äŃĆŹ, ŃĆÄļ»ĖņłĀņé¼ņŚ░ĻĄ¼ŃĆÅ 36(2019), pp. 7-32ņ░ĖņĪ░.
Fig.┬Ā1.

Fig.┬Ā2.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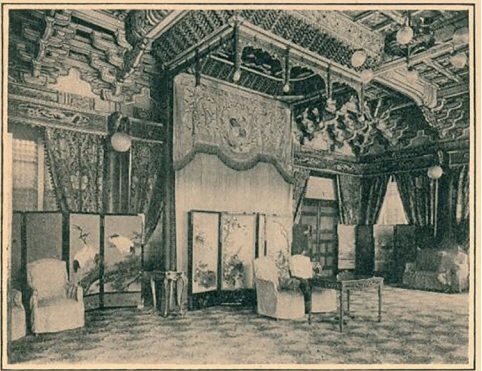
Fig.┬Ā3.

Fig.┬Ā4.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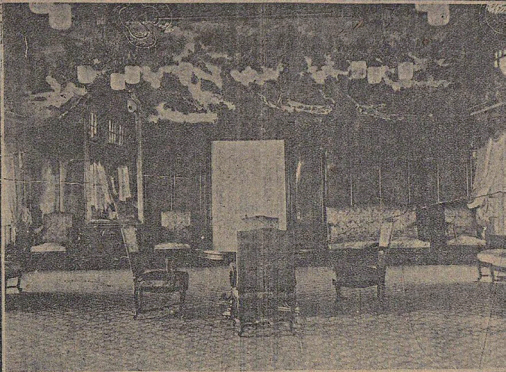
Fig.┬Ā5.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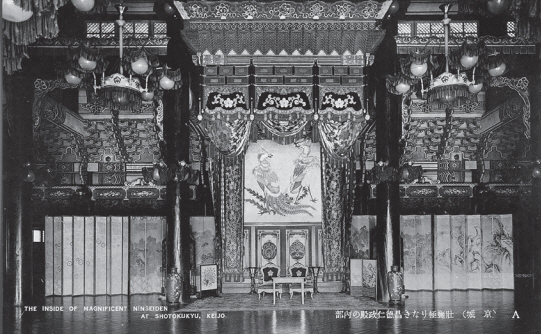
Fig.┬Ā6.

Fig.┬Ā7.

Fig.┬Ā8.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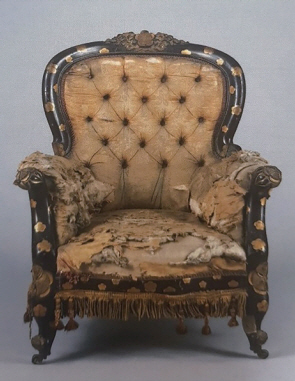
Fig.┬Ā9.

Fig.┬Ā10.

Fig.┬Ā11.

Fig.┬Ā12.

Fig.┬Ā13.

Fig.┬Ā14.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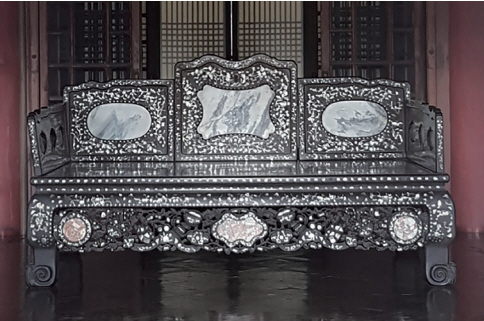
Fig.┬Ā15.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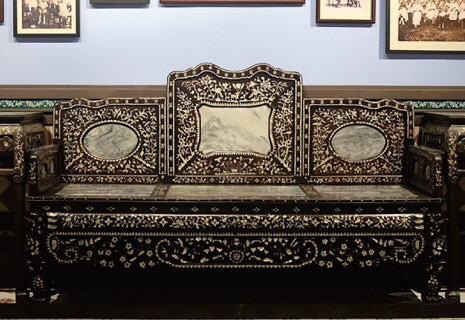
Fig.┬Ā16.

Fig.┬Ā17.

Fig.┬Ā18.

Fig.┬Ā19.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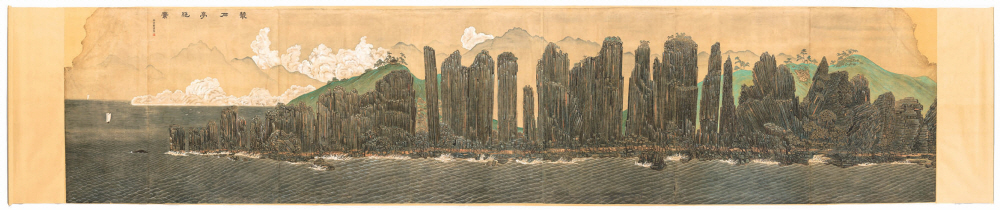
Fig.┬Ā20.

REFERENCES
- TOOLS